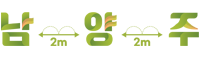진정한 장애인 복지에 대한 견해는, 단 몇 가지로 요약 될만큼 간단하거나,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글 제목에서 말하는 장애인복지의 본질이란, 장애인이라는 용어자체가 없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장애인복지과라는 행정기관의 부서조차도 필요 없는 상황을 말한다.
다시 말해 서, 장애, 비장애를 구분하지 않는 국가공동체를 희망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성 제로인, 그래서, 구두선에 그칠만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의 주장대로, 진정한 장애인복지를 이루려면 가장 우선되어야 할 일이 장애, 비장애를 구분 짓는 일부터 사라져야 한다.
우선, 장애인이라는 용어부터 없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장애, 비장애를 구분 짓는다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특수한 신분임을 공적으로 인정시키거나 시키려는 것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이 주장의 핵심은, 장애를 가진 이들을 사회적으로 차등을 두지말자는 것이다.
다만, 장애를 가진 이들에 대해서는, 몸이 불편한 정상인이라는 보편적 시선이 일반화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현상일 터이다.
그 바탕 위에서, 불편한 정상인을 위한 사회적, 행정력의 배려와 보살핌이 이루어질 때 진정한 장애인 복지가 완성된다는 생각이다.
사실, 말이 쉽지 수십 세기를 이어져 내려온 관습이나 시선이 하루아침에 바뀌거나 그럴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
하지만, 역사적인 시선으로 보면, 사회 문명의 진화나 진보는, 미완성을 전제한 후 이루어진 성과 이자 과물에 다름 아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문리나 물리적 관점에서 아무런 흠결 없이 완성된 것이 어디 있으며, 있었다면 과연 무엇이었는가.
세상은 늘 가변적이거나, 상시 그럴 개연성이 상존하고 있다
학자들의 학술이나 논리의 근거도, 시류에 따라서 수정되거나 사라지는 법이다.
예컨대, 이질, 학질, 결핵에 목숨을 담보해야 했던 시절이 분명히 존재했음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다.
하지만 인류의 의학은 이를 극복해냈다.
장애, 비장애 구분하지 않은 정도쯤이야 노력여하에 따라서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지구가 둥글다는 주장을 했던 갈릴레오를 정신질환자 취급했다는 사실이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 충분히 보충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생각이다.
세상의 모든 법이나 규범, 가치는 늘 가변적 요소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굳이, 장애, 비장애를 구분하지 않는 시도(試圖) 역시도,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불가능할 것 이라는 선입견이나, 이와 관련한 고정관념만 없애준다면 한번쯤 시도해 봄 직한 일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문제는, 장애 당사자나, 행정기관, 정치기관 등에서 장애인에 대한 보다 넓고 높은 세련된 사고 개념을 도입하거나 사유 깊은 철학적 기반을 바탕으로 가능한 일이라는 점이다.
서구 선진국을 바라볼 필요조차 없다.
그들은 그들이고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이다.
만사 천사를 선진제국의 흉내나 내다가는 영원한 이등 국가로 전락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홍익인간을 주창했던 단군의 후손답게 장애, 비장애 구분 없이 모두 공동체 주체로서 밝고, 맑게 웃으며 살아보자는 말이다.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
- 1김종배 위원장,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 점검에 관한 …
- 2오창준 의원, “22대 국회에서 장애인고용법 개정 추진해야”
- 3고은정 의원,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본회의 통과
- 4김동희 의원, “장애인 이동이 자유로운 성숙한 경기도 기대”, 특별교통수…
- 5유호준 의원, 경기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출범대회 참석
- 6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 장애인 복지관 급식비 지원 및 장애인복지단체 종…
- 7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 제19회 전국장애인문학제 시상식 성료
- 8광명소방서, 장애인복지시설 대상 현지적응훈련으로 화재 안전성 확보
- 9남양주시북부장애인복지관-㈜아가세, 고령 장애인 일상생활 지원 맞손
- 10부천시, ‘원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시니어생활안전관리지도사 방문사업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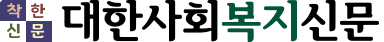
 PDF 지면보기
PDF 지면보기